
‘난설헌’은 9년 전 여성 소설가 최문희가 쓴 장편소설이다.
‘난설헌’은 조선 중기의 천재적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그녀의 빛나는 시편들이 한없이 고단했던 삶의 고통을 디뎌가는 과정 속에서 도래한 것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심사평)
최문희 작가는 이 소설을 발표해 제1회 혼불문학상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허정윤 지음 ‘오누이’가 서점에 나왔다. ‘오누이’는 문인이자 학자인 허균(許筠. 1569~1618년)과 여류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년)이다.
허균은 열다섯에 결혼한 누나 초희(楚姬)에게 그리움의 편지를 보냈다. 시집 간 누나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아이들을 잃었고 남편과 시댁의 냉대 속에 살았다. 그녀의 시적 재능은 사라져 갔다. 그런 참혹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 하고 난설헌은 스물일곱에 세상을 떠났다.
‘오누이’ 집안은 조선 중기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도 오문장가(五文章家)로 우리 문학사에서 뛰어난 봉우리 가운데 하나이다. (허경진, ‘허균평전’ 2002년)
허난설헌의 가계도(家系圖)를 보자.
아버지 허엽, 큰 오빠 허성, 둘째오빠 허봉, 허초희, 동생 허균이다. 아버지 허엽에게 첫째 부인 청주한씨에서 1남 2녀를, 둘째 부인 강릉김씨와는 2남 1녀를 뒀는데 난설헌과 허균은 여기에 들어간다.
허엽(許曄. 1517~1580년)을 살펴본다. 화담 서경덕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퇴계 이황과 함께 학문을 논했다. 문과에 급제(1546년)한 후 사간원 대사관에 올랐다. 1568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서는 향약의 실행을 건의했다.
허엽은 1579년 조정의 명을 받아 영남관찰사를 맡아 선정을 베풀었다. 요직에 부름을 받고 중앙으로 올라가다상주의 객관에서 병이 돋아 세상을 떠났다. 삼강이륜행실을 편찬하고 저서로 ‘초당집’을 남겼다.
허엽의 장남 허성(許筬. 1548~1612년)은 문과에 급제(1583년)하고 일본에 서장관(書狀官)으로 다녀와서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략할 징조가 있다고 왕에게 고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난 후 이조판서에 등용됐다. 학문과 덕망으로 사림(士林)의 촉망을 받은 허성은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악록집(岳麓集)’을 남겼다.
2남 허봉(許封. 1551~1588년)도 문과에 급제(1572년)했다. 1574년에 명나라에 서장관으로 다녀와서 기행문 ‘하곡조천기’를 썼다. 최종관직은 성균관 전한에 이르렀다. 지방에 있으면서 병조판서 이율곡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유배됐다. 38세 나이에 병으로 객사했다. ‘하곡집
(荷谷集)’을 남겼다.
다시 허초희(1563~1589년)를 돌아본다. 호 난설헌으로 더 유명하다. 강릉에서 태어난 초희는 15세에 안동김씨 가문의 김성립에게 출가했다. 조선조 3대 여류시인이며 난설헌시집이 동생 허균을 통해서 명나라 사신에게 전달돼 중국에서도 ‘허난설헌집’이 출간돼 큰 인기를 끌었다. 18세기에는 일본에까지 그녀의 시가 전해져 널리 애송됐다.
끝으로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문과에 급제(1594년)한 후 관리로 여러 기관에서 봉직했다. 선조 시대에 명나라 사신을 영접할때 탁월한 명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난설헌집’ 목판본을 출간했다. 공주 목사 재임 중에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한 조선조의 대표적 소설 ‘홍길동전’을 지었다. 일부 학자는 ‘서자로 태어난 허균이 불공정한 현실을 비판하고자 이러한 소설을 쓰게된 배경이 됐다’고 평한다. 병조, 예조판서를 지낸 허균은 혁명을 도모하다 처형 당했다. 오문장가들은 명나라와 일본 등 외교 문제를 놓고 왕실에 경각심을 불어 넣은 일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강릉에서는 매년 4월에 허난설헌문화제, 9월에는 허균문화제가 열린다.
허균·난설헌 기념관은 관광명소다. 400여 년 전 명문을 남긴 난설헌과 허균 ‘오누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안겨준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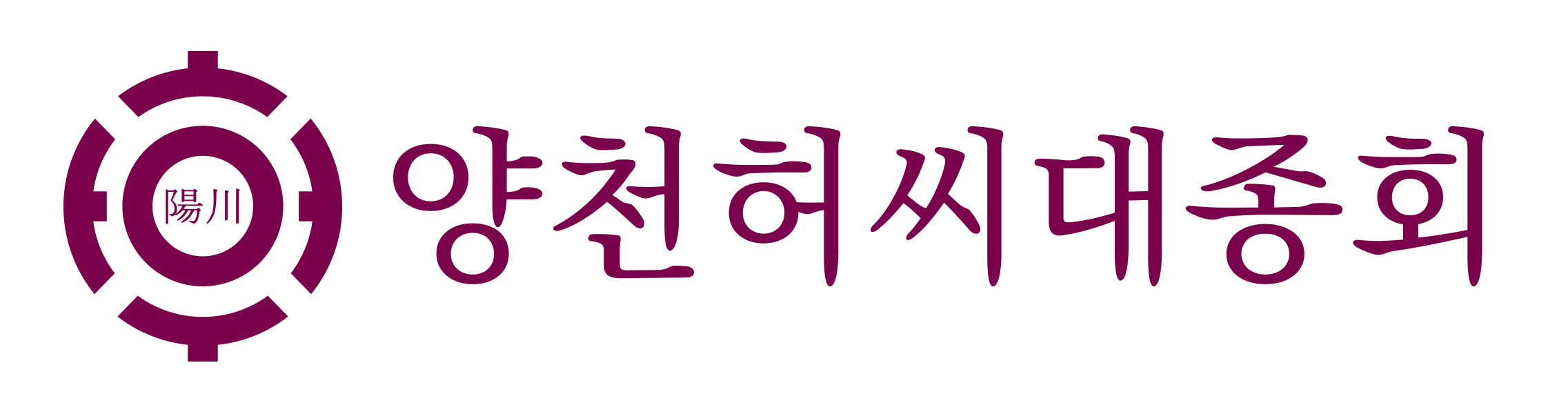
댓글 목록